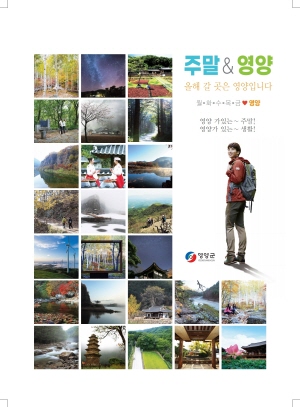- |
- UPDATE :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매교동 골목길
‘하늘을 들여다보면/무슨 부호처럼/떠나는 새들/자 떠나자/무서운 복수(複數)로 떼 지어 말없이/이 지상의 모든 습지/모든 기억이 캄캄한 곳으로.’
황동규의 시 철새의 한 대목이다.
고등학교 때 읽은 이 시를 나는 아직도 입속의 알사탕처럼 굴리고 다니며 가을마다 끄집어낸다. 무사 무사히 한 해를 접고 이 침묵의 시간을 조용히 전송하는 계절이다. 예측 없는 캄캄한 의식을 붙잡고 또 다른 봄을 향해 떠나는 철새처럼.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매교동 골목길] 매교동 골목길도 차가운 날씨에 정적이 드리웠다. 전국을 들썩인 살인사건이 났던 골목이다. 요즘 들어 이 길도 오피스텔과 큰 주택이 들어서며 조금씩 밝아졌다. 천지개벽이라고 해야 할까. 부근에 1천500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됐고 더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는 진화와 소멸이 공존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빌딩 속엔 한 시절의 추억이 묻혀 있다. 저녁이 내리면 매교 근처 포장마차엔 모락모락 김이 올랐다. 따끈한 우동 한 그릇에 소주 한잔 걸치면 하루가 스르르 풀렸다. 원조 팔미옥도 그립다. 팔미옥의 할머니가 숙성시킨 고기는 맛은 물론 원탁이 주는 따뜻한 정감이 배어 있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거리가 나에게 어떤 희로애락이 될지 또 다른 상상의 계절들이 나무처럼 자란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달성문학동우회 ‘시앤시’ 동인지 제3집 발간 및 시화전 개최] 2서양화가 김복동 작가, 생명 존중의 미술적 표현 "기원-존재" 개인전 3방화문 닫기 실천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자 4한국화가 고재봉 작가, 자유로운 형상 예술로 승화시킨 '천년의 향기 소나무展' 개최 5산울림의 김창훈 11월15일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단독 공연 개최 6‘초대형 가마솥밥’에 숟가락 얹다…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22~26일 개최 7팝페라 테너 임형주, 드림온앙상블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하모니’ 콘서트 개최 8한경국립대학교,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촌에 스마트 교실 구축 9수묵화가 정현희 작가, 실경에서 찾은 피안의 세계 "Nature of Korea" 개인전 10[대구 달성 문인동우회 소속 "시앤 시" (회장 한동선)등과 어르신 위로 자선 봉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