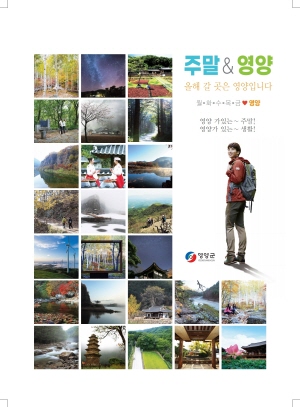- |
- UPDATE :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손절하는 사회… 헤어지지 않을 결심, 연대하겠다는 약속
살면서 한번쯤 맞닥뜨리는 부당한 시스템, 고뇌·이해 쏟아내 연대하는 방법으로 맞서 ■ 해방의 밤┃은유 지음. 창비 펴냄. 364쪽. 1만8천원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존엄을 침범하는 규범과 맞닥뜨린다. 누군가의 딸로서, 아들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사회가 만들어놓은 성별 역할에 저마다 분노가 차오를 때쯤 부당한 규범에 대항하는 손쉬운 방법, '손절'이 등장했다. 내 가치관에 배치되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못마땅하면 안 보면 되고, 비위에 거슬리면 엮이지 말자'.

[■ 해방의 밤┃은유 지음. 창비 펴냄. 364쪽. 1만8천원] 은유 작가의 신작 '해방의 밤'은 일방통행, '손절'이 시대정신인 사회를 역행하는 에세이다. 책은 부당한 사회 규범을 공고히 하는 위험지대, 내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 든든한 안전지대 모두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오간다. 미셸 바렛 '반사회적 가족(2019)', 캐럴라인 냅 '욕구들(2021)' 등 사유의 과정을 얻어온 다른 책을 글 위에 함께 싣기도 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누군가의 딸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저자의 고민과 리베카 솔릿의 에세이 '세상에 없는 나의 기억들(2022)'이 맞물린다. 명절마다 돌림 노래하듯 가부장제의 굴레는 반복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착실하게 살림을 꾸리는 건 딸의 역할이었다. 저자는 부당한 시스템에 연루된 이들과 연을 끊기보다는 제법 독특한 방식으로 맞선다.
"가부장제의 마지막 요새는 뜻밖에도 친정입니다. … 간소한 반찬 몇가지를 출장 뷔페처럼 이고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솔릿의 에세이를 읽고서 얻은 다짐을 전한다. "내가 바라는 건 명절의 철폐도 아버지와 밥 먹지 않기도 아닙니다. 집을 밥의 즐거움을 되찾는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 끊어내지 않고 연결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천적 관점에서 깊이 읽기"를 지향한다는 선언 때문일까. 책은 누군가를 손쉽게 적으로 지목하거나, 부당한 규범을 상투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고뇌와 이해의 과정을 쏟아낸다. 그러고선 나와 타인, 우리를 통제하던 고정된 생각이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질 때 비로소 해방을 맞이한다는 성찰에 이른다. '손절'이 미덕이 된 사회에서 저자의 고백은 묵묵히 연결, 그리고 연대를 가리키고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한국화가 고재봉 작가, 자유로운 형상 예술로 승화시킨 '천년의 향기 소나무展' 개최 2산울림의 김창훈 11월15일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단독 공연 개최 3‘초대형 가마솥밥’에 숟가락 얹다…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22~26일 개최 4팝페라 테너 임형주, 드림온앙상블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하모니’ 콘서트 개최 5한경국립대학교,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촌에 스마트 교실 구축 6수묵화가 정현희 작가, 실경에서 찾은 피안의 세계 "Nature of Korea" 개인전 7[대구 달성 문인동우회 소속 "시앤 시" (회장 한동선)등과 어르신 위로 자선 봉사 실시] 8[신간] [트렌드 코리아 2026]쓰나미, 인간 역량이 가치를 만든다 9방화문 닫아야 하나 열어두어야 하나? 10[신간] “연필로 쓴 위로”…‘석양의 뒷모습’, ‘담쟁이는 벽을 종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