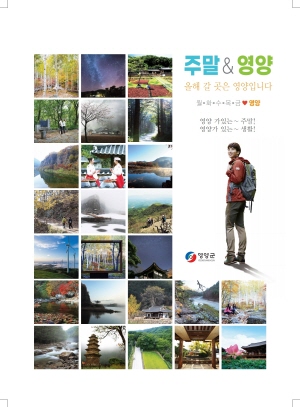- |
- UPDATE : 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국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 】
〖비민주 오만의 독주〗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시인] 강하면 부러지며 부러지면 비극을 맛보고 재차 일어나는 일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 행동으로 정치를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정의 공정의 법칙이 아니다
공평하고 옳은 순리를 따른다는 가정 법이라 해도 이것은 아니올시다. 이다
인간은 언제나 정의라는 잣대를 앞세우는 일이 합리적으로 정리되면서. 이러한 이치가 어긋난다고 하면 이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기에 우리 사회에 해악만 키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장 했듯이 민주주의는 이성과 자정능력이 있을 때 사실상 꽃을 피우는 사상이라-
국가를 위해 이성과 자정이 불을 켤 때 비로소 다수가 지배하는 판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우리는 현실사회에서 민주라는 말은 전가의 보도처럼 내가 갖는 것이 오로지, 라는 패권적인 사고가 지배해 온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불통은 막힘이라는 벽이 나타나며 독선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오늘날에 이른다. 나는 가장 옳고 바르며 너는 타도의 대상이며 이중성 오만의 억지를 강변하는 데서 민주라는 말은 슬픔을 견디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독선적인 북한의 이름조차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미명을 달고 있어 합리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어용문학 등 4가지 축은 민주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폭력과 억지를 포장하는 단체들이 아닐까?
물론 양비론적인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의 합리가 있을 수 있으나 기실 초창기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현장에서 불합리에 도전하는 정신은 찬사와 감동을 하였지만 이후 정치적인 색채 가미에 따라 독선과 불합리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전반적 사회를 양극으로 몰아가며 목소리 크고 다수만이 정의라는 인식하에 국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행동을 보이면서 지적의 대상이라면 다수의 국민에게 엄한 징벌이 가해질 것이다.
사실 숫자로 따진다면 극소수가 대다수를 압도하는 지경에는 독선과 위장으로 악을 쓰는 소리에 결국에는 다수가 체념 혹은 포기하는 전략이 지금까지 통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집요의 방법, 즉 개싸움의 원리가 통한다는 뜻에서 전법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전법과 이중성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양립시키는 일이며 실리를 챙기고 사회 중심에 서 있으니 이 양립은 평행선으로 가게 되어 백성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바뀌며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사회 현상은 바로잡히는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간의 낭비가 자심<滋甚>한 것이 문제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인내를 앞세우는 일이지만 이런 지경은 오늘날도 잘 통하는 전략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에 참으로 유치하고 이중성이 잘 드러나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촛불이 민주주의 본질처럼 호도하는 이른바 선동하는 사람들의 눈치 보기는 이미 선을 넘어 도를 넘었고 마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수결 원칙에 정치적 결정을 시행했던 방법이 이 땅에서 다시 현실화가 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이다.
그러나 이런 선동의 정치는 자칫 우매한 소리 게임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니 국민과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동의 위험이 내재하고 또한 그 선동이 중심에 권력을 끌고 가려는 우매하고 바보들의 행진이기에 위험이 증대한다.
정말 순수로 시작했던 함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멈추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지점이 아닐까?
제도적인 장치는 늘 가동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은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을 선동가에게 의사<意思>의 길을 헌납하는 우직스러운 일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서 악착<齷齪>한 그룹이 중심처럼 행동하는 길을 만들어 줄 뿐이다.
노동계의 숫자나 문학의 예술 진영이나 교육 현장에서 거의 같은 지경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점차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여전히 권력적인 패권을 노리는 암담함도 진행형인 것도 사실인 듯하다.
정치는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일이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북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날 정도이다.
사실 극단적인 구분이라 합리성을 갖는 말은 아닐 것 같기에 노심초사(勞心焦思)이다.
이제는 사실의 점검에서 햇살에 노출 시키되 어떤 계산서가 옳은지를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균형 잡힌 틀 속에서 뚜껑을 열고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결코 민주주의 본질이 아니라면 과감히 탈피하여 서로가 자각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것이다. 사실 법<法 >이란 이성<理性>이고 소리나 악을 쓰는 감정이라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성보다는 소리 게임이 우세한 것은 <아직도>라는 말에 이성의 민주주의가 신음한다는 뜻이다.
사실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본다.
인품과 성정<性情>의 모든 세세함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는 구심점을 찾아 궁극의 지점이 모아 모아져야 하며 희망과 정상적 사회를 기대하면서 지식인들과 문학인들의 정신이 바로 설 때 사회 또한 빛나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정치는 바로 정직한 민주주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가 민망하다.
어느 땐들 신음과 고통 그것이 없을까만
국민 노릇 하기가 힘겹고 버겁다.
정치꾼들이 아귀(餓鬼) 같아 입만 큰 자들
신의 줄기, 믿음의 줄기는 언제나 배신의 칼날 되어
헐떡이는 이 땅의 거친 숨소리가 표변하는 입 큰 자들의
변절의 찬가들만 설쳐대고 있어 조국의 깃발만이 펄럭이고 있다.
<조국의 깃발> 졸시
자고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주도층은 일반 백성이었고 이른바 거짓만 늘어놓는 이 나라의 정치꾼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란 등 지도층 양반들이 줄행랑칠라치면 그 자리를 피 흘려 싸운 백성들인데-
심지어 을사오적 중 1명을 제외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그들 달관의 혀는 놀라울 만큼 합리적이었으니 말이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순수를 我田引水 하면서 정치 놀음으로 합리와 자기화시키며 이분법으로 성행하는 정치꾼들은 사라져야 한다.
또다시 다수의 수로 촛불 위에 올라타는 기획 꾼들의 높은 목청에 찬물을 부어야 한다.
이제 문학인들이 정신이 바로 설 때, 작품 또한 빛나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문학은 오로지 정신의 가치 정신의 곧음으로 가야 한다는 논지로 가름하며 에필로그 한다.
2024. 01.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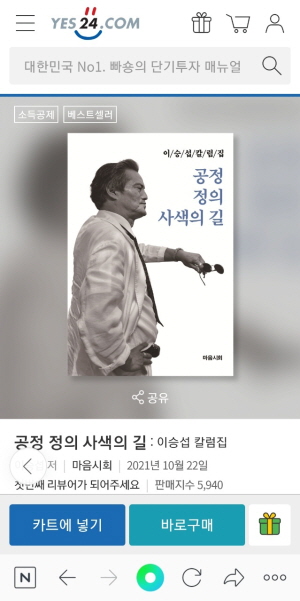
[필자 저서]
[필자 저서]
[필자 저서]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주우석 작가, 그림 없는 도발적 미술전시 "마음예술展" 개최 2[달성문학동우회 ‘시앤시’ 동인지 제3집 발간 및 시화전 개최] 3서양화가 김복동 작가, 생명 존중의 미술적 표현 "기원-존재" 개인전 4방화문 닫기 실천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자 5한국화가 고재봉 작가, 자유로운 형상 예술로 승화시킨 '천년의 향기 소나무展' 개최 6산울림의 김창훈 11월15일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단독 공연 개최 7‘초대형 가마솥밥’에 숟가락 얹다…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22~26일 개최 8팝페라 테너 임형주, 드림온앙상블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하모니’ 콘서트 개최 9한경국립대학교,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촌에 스마트 교실 구축 10수묵화가 정현희 작가, 실경에서 찾은 피안의 세계 "Nature of Korea" 개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