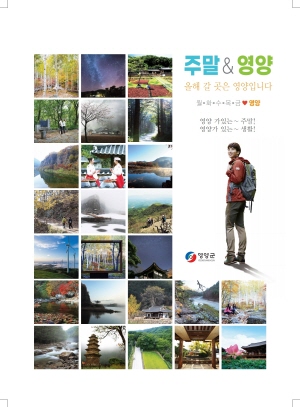- |
- UPDATE :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상처와 상처가 스치고… 사랑이 사랑과 스칠 때를 기억하라
국적·인종 뛰어넘는 '상처 치유' 이야기, 개인적 아픔겪은 작가…7년간 책에 심혈, "그럼에도 한번 살아보자" 위로 녹여내 ■ 아일랜드 쌍둥이┃홍숙영 지음. 클레이하우스 펴냄. 256쪽. 1만6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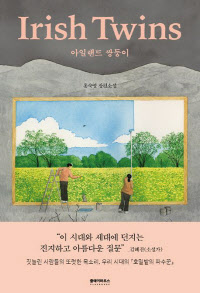
[■ 아일랜드 쌍둥이┃홍숙영 지음. 클레이하우스 펴냄. 256쪽. 1만6700원] '아일랜드 쌍둥이'. 같은 해 다른 날에 태어난 형제를 부르는 말이다. 피임을 하지 않는 아일랜드계 가톨릭 이민자 가정을 조롱한 데서 출발한 용어로, 신간 '아일랜드 쌍둥이'에는 1월과 12월에 태어난 두 형제 재이와 존(종현)이 있다.
재이와 존은 한국 이민자 아버지와 미국 선주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존은 형 재이가 병을 앓다가 죽은 후 마치 형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미군으로 일본에 파견돼 쓰나미 현장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후 장애가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체성과 사연을 지닌 주인공들이 미국 남부 가상의 주에 모여 살고 있다. 수희는 한국 여성으로 군인이었던 동생을 잃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왔고, 존의 초등학교 동창 에바는 태어나자마자 여섯 번째 손가락 두 개를 잃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미술치료 워크숍. 묻어둔 상처를 끄집어내 흉터를 바라보고 치유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다. 기자와 PD,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하며 이야기가 지닌 치유의 힘을 믿어온 홍숙영 작가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저자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미국으로 간뒤, 대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젊은이들의 슬픔과 고민을 마주했다.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손잡아주며 내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탄생하게 됐다.
책에서 다루는 동일본대지진의 후유증, 방사선 피폭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등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다. 저자는 이러한 인물들의 크고 작은 굴곡을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그들의 감정과 사고를 날카롭고 힘 있게 담아낸다. '그럼에도 한번 살아보자', '내일로 나아가도 된다'라고 위로하면서 말이다.
개인적 아픔과 사회적 슬픔이 녹아든 책을 통해 저자는 상처가 상처와 스치고, 사랑이 사랑과 스쳐 이 세상이 조금은 따스해지기를 소망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 상처를 갖게 된다. 이를 그저 깊숙하게 묻어둔 채 외면하려 하지 않고, 충분히 들여다보며 치유해 나간다면 새살은 돋아난다. "맨 밑바닥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위안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버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산울림의 김창훈 11월15일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단독 공연 개최 2‘초대형 가마솥밥’에 숟가락 얹다…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22~26일 개최 3팝페라 테너 임형주, 드림온앙상블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하모니’ 콘서트 개최 4한경국립대학교,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촌에 스마트 교실 구축 5수묵화가 정현희 작가, 실경에서 찾은 피안의 세계 "Nature of Korea" 개인전 6[대구 달성 문인동우회 소속 "시앤 시" (회장 한동선)등과 어르신 위로 자선 봉사 실시] 7[신간] [트렌드 코리아 2026]쓰나미, 인간 역량이 가치를 만든다 8방화문 닫아야 하나 열어두어야 하나? 9[신간] “연필로 쓴 위로”…‘석양의 뒷모습’, ‘담쟁이는 벽을 종교인 것처럼’ 10서양화가 조경 작가, 우리 민족이 사랑한 소나무 이야기 "영혼의 울림" 개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