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새로나온책] 좋은 박물관, 위험한 박물관
좋은 박물관, 위험한 박물관, 김기섭 / 주류성 / 2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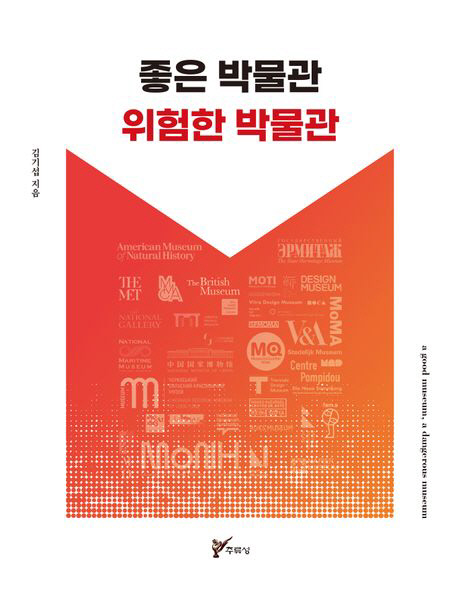
[새로나온책] 좋은 박물관, 위험한 박물관] 학술 연구 및 사회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박물관은 유물, 예술품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며 전시하는 곳이다. 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콘텐츠들을 운영하며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건물이 노후됐을지언정 우리에게 해가되는 ‘나쁜 박물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
책 ‘좋은 박물관, 위험한 박물관’은 한성백제박물관장, 경기도박물관장 등을 역임한 저자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로, 박물관의 역사와 유래,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황, 국공립박물관의 역할 등을 담았다.
저자는 누군가 잘못한 일을 숨긴 채 덧칠·분칠한 박물관, 손톱만한 공적을 대문짝만하게 포장한 박물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박물관, 핵심도 메시지도 없이 횡설수설하는 박물관 등을 가리키며, "사람들은 나쁜 박물관이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저 그렇거나 시원찮은 박물관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나쁜 박물관이 꽤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좋은 박물관은 어떤 곳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준다. 저자는 좋은 박물관의 기준으로 ▶ 전시·교육 내용이 믿을 만한 곳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앞날을 함께 고민하는 곳 ▶다양한 전문가 직원이 많은 곳을 꼽는다.
위의 박물관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학계와 소통하며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며,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 만들어 가려 애쓰고, 여러 문화유산과 미래 유산을 직접 관리하며 조사·연구, 전시·교육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책은 유네스코 통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주소를 살핀다.
인구 1만 명당 박물관을 1개씩 세운 미국을 비롯해 박물관 1개에 독일 1만2천 명, 프랑스 1만3천 명, 캐나다 1만7천 명, 이탈리아 1만8천 명, 영국 2만1천 명, 일본 2만1천 명꼴임을 언급하며, 전체 박물관 수 1천102개에 불과해 인구 4만6천 명당 박물관 1개인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저자는 선진국일수록 박물관 사회교육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 중심의 서구사회는 학교에서의 노골적인 이데올로기 교육 대신 사회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높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해왔는데, 경험이 같을수록, 지식을 공유할수록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비슷해진다는 관점에서 박물관을 많이 지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 국공립박물관들의 공적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책에 담겼다. 박물관에서 전시·교육·자료관리·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학예사가 되려면 치열한 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공정성을 높이려는 채용 방식의 한계 때문에 정작 박물관 학예사들의 전문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박물관을 생생한 사진과 친절한 설명으로 실어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며, 저자가 역사학자로 활동하고 박물관에서 일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안타까운 실수, 후회 등을 에피소드 방식으로 진솔하게 풀어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중앙노동경제연구원의 용인 중앙직업전문학교, 고용노동부 지정 5년 연속 우수교육기관 선정 2[눈 내리는 밤] {전진식 시 낭송} 3서숙양 작가, 생명의 빛 표현 ‘Flow of Light(빛의 흐름)’ 청담 보자르갤러리에서 개인전 4[새로 나온 책] 최박사의 운동 혁명 5[신간] 꿈을 이룬 ‘도전의 길’… 이길여 회장의 발자취 6[신간소개] ‘탱고, 백년짜리 지구별 여행에 최고 반려 취미’, 7박명수 경기도의원 ‘기회의 땅 안성’ 출판기념회 개최 8지자체 유행탄 파크골프장, 곳곳서 주민 갈등 ‘몸살’ 9경기도 ‘도서관 1번지 수원’… ‘책 살 체력’은 해마다 빠지고 있다 10[새로 나온 책] 살고 싶은 마을의 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