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1. 문학의 정체성과 사상의 예술혼】
『정신 사상의 심화』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시인 미래의 풍요를 위해 우리는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사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는 예술은 희망의 인도와 예언의 역할을 해왔다면 풍요의 시대의 예술은
장식의 기능이라 한다고 한다. 또한 예술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이성의 회복을 기할 수 있을 때 인간성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간성의 돌변은 가치가 변모할 때 가장 불행한 경우에 직면한다면 예술은 인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 보는 것이다.
미술은 안정감의 여행(旅行)을 촉구하고 상상(想像)의 부산물로 따라올 때, 현실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의식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은 긴장감을 가질 때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기 발견의 모티브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極大化)로 시키느냐의 함량(含量)에서 훌륭한 문학의 업적이 달성된다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 오로지 상업적으로 의존해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표현(表現)의 자유가 구가되는 현상을 올바른 판단이며 미래를 낙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문학은 심도에서 사상(思想)의 승화(昇華)가 부족하다는 말을 명망이 높은 어른들을 말한다. 감각적(感覺的)인 표현(表現)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작품 속에 진지한 사상의 깊이에 고갈 현상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서로 갈라진 남북의 이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문화(文化)에 녹아있는 생각의 문제이기에 참혹한 전쟁을 겪어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같은 위대한 전쟁 문학이 결여가 되어 삼국의 정립에 따른 각축을 다룬 진정한 역사적인 통찰(洞察)의 안목이 없었으며 근대사로 와서는 온갖 전쟁의 참화(慘火) -
7년여의 임진왜란, <三拜九叩頭>의 삼전도에서 청나라 왕에게 항복 문서를 갖다 바친 병자호란, 또는 6.25의 비극은 너무도 통렬(痛烈)한 가슴의 아픔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둔감하고 남의 시비에는 민감한 정서를 <우리>라는 두루뭉술로 포장하는 관용이 있기에 그새 나의 비극을 잊어버리는 징후가 사상의 심화에 미흡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사상은 결국 자신의 문제로 시작해서 객관을 바라보는 접근법, 귀납적 논리학이 주류를 이룬다면 우리는 연역적 논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보편에서 특수로 가는 결말이기보다는 보편에서 시작하여 다시 보편적 논리로 익숙한 것이
추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귀납적 논리도 아니고 연역적인 논리도 아니며 중간에 머무는 일 때문에 특성이 없는
결말에 직면하는 것은 아닐지-
여기서 우리 문학의 심도(深度)는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고 함이 안타까움일 것이다.
만약 서구적인 사상의 발전 모델이라면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서 출발하여 결국 우리로 돌아가는 공허만이 있을 뿐 깊이가 내재 되어 표피(表皮)적인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한때 유행했던 대하소설도 대부분 가족사이거나 이데올로기의 분열상만 파노라마로 보여
(Showing) 주었을 뿐 정작 작가의 고뇌(苦惱) 어린 해답(heaithy, thoughts)은 없다고들 하지 않던가?
소설(小說)은 갈등을 다루면서 시간의 정리라면 결국 그 스토리에 깊이엔 작가의 사상(思想)이 뼈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랑방 이야기가 되는 고작이라 하지 않을까?
톨스토이의 대작품에서는 그런 대답이 가득하며 예를 들자면 결론(結論)은 자명해지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귀족으로 자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땅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땅만으로는 살 수 없다>나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은 결국 언행이 일치된 사상적(思想的) 표현(表現)의 결집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러시아 농민혁명(農民革命)의 도화선(導火線)이 된 톨스토이 그가 추운 1월 우랄 철도의 시골 역장실에서 쓸쓸하게 죽었을 때 그의 마부도 따라 죽은 감동(感動)은 그의 깊은 인간미에 대한 참된 삶의 실현이고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의 유언의 마지막 말이 “진리(眞理)를 나는 열애(熱愛)한다.
왜 저 사람들은 이란 마지막 말에도 그의 사상(思想)은 녹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찾는 여행은 문학인의 영원한 사명이라 황금찬 선생이 말했듯이 현실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구현되는 주인공과 등가(等價)를 이룰 때, 작품(作品)은 비로소 생명력(生命力)을 획득하는 것이라 수차 강의를 들은 바 있다.
20세기의 최대 소설인 <모비딕>의 작가 멜빌은 살아 있을 때 온갖 모멸과 굶어 죽다시피 했고 죽었을 때는 신문에 부고(訃告)한 줄도 나오지 않을 만큼 무시와 고독을 감내(堪耐)했으며 생전에 1775 수의, 시(詩)를 쓴 미국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 은 살라 7편쯤 발표한 시인이었지만 70년 후에 평론가들의 연구 때문에 빛나는 미국의 시인이 된 일이나 우리의 한용운 선생은 1926년 <님의 침묵>을 발표한 것은 3.1운동의 실패, 감옥살이 3년을 겪고 난 후에 모조리 변절한 사람들의 슬픔과 좌절감을 백담사 오세암에서 쓴 고독한 사랑에의 뜻을 담은 88편은 연작시라는 점 --
1965년 – 그러니까 40년 후에 박노순, 인건한, <한용운 연구>에 의해 유명의 시인으로 등극을
했으며 생전에는 동요 몇 편을 발표한 윤동주 선생도 해방 이후 유고 시집으로 살아난 시인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애라는 휴머니즘의 사상에 깊은 감동을 시적으로 표현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인이며 또한 이육사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의 표현은 언제나 자기를 고백하고 또 주장하면서 자기만큼 표현하는 특성과 일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결국은 나를 어떻게 혹은 얼마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표현의 심도(深度)에 감동(感動)의 파문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고로 자기에 몰입하거나 깊이 빠지게 되면 도그마의 함정(陷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경계(經界)의 몫이라는 조언이 뒤따르지 않을까?
명작(名作)의 조건은 하나같이 자신을 버리고 제3의 공간(空間)을 창조(創造)하는 길을 얼마나 진정성으로 표현(表現)하는가에 여부에 따라 인간애의 따스함도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강조가 옳지 않을까?
대부분 문학은 정신이라 하지 않든가
문학의 본질은 결국 사상(思想)의 실현(實現)이고 어떻게 구조화(構造化), 시키는가의 따라 소설이 되며 수필(隨筆)이 되고 이미지를 결합(結合)하여 시(詩)가 된다는 것이라면 본질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일 것이다.
표피(表皮)적이고 감각적(感覺的)인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넋두리로 본인을 감추는 것은 문학적인 깊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시대적인 의미(意味)에서 안정감(安定感)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때나 비극(悲劇)은 있으며 슬픔도 있지만 여기서 희망(希望)의 대칭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은 언제나 이를 방지하는 깨달음의 약이 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혼이 필요한 소이(所以)가 아닐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갖고 내면의 마음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더불어 정체성의 정신이라고 믿으며 에필로그 한다.
2024. 07.
대중문화평론가/칼럼리스트/이승섭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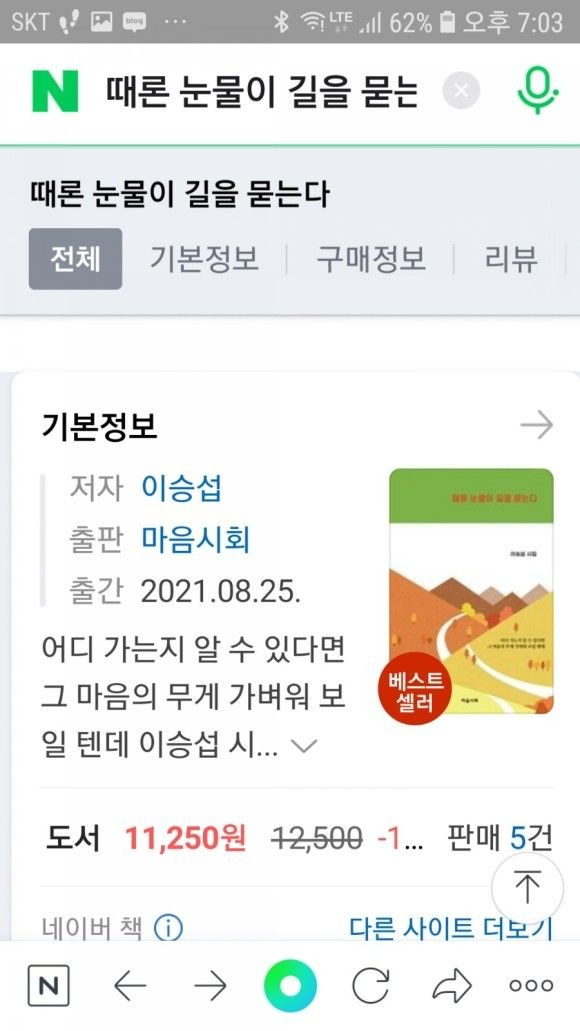
[필자의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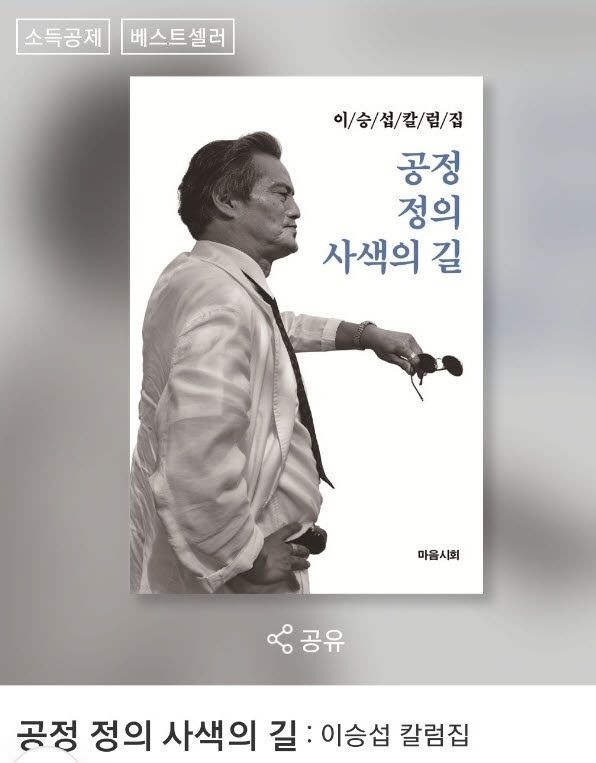
[필자 칼럼집] 
[필자 시평집]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니언
1[새로 나온 책] 최박사의 운동 혁명 2[신간] 꿈을 이룬 ‘도전의 길’… 이길여 회장의 발자취 3[신간소개] ‘탱고, 백년짜리 지구별 여행에 최고 반려 취미’, 4박명수 경기도의원 ‘기회의 땅 안성’ 출판기념회 개최 5지자체 유행탄 파크골프장, 곳곳서 주민 갈등 ‘몸살’ 6경기도 ‘도서관 1번지 수원’… ‘책 살 체력’은 해마다 빠지고 있다 7[새로 나온 책] 살고 싶은 마을의 정석 8사진작가 '구미숙, 연도흠, 류중열 3인전'으로 2025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가 9[신간] ‘자름과 잇기’로 구축한 미학… 이병국 시집 ‘빛그늘’ 10방화문, 닫혀 있을 때 비로소 열리는 ‘생명의 문

























